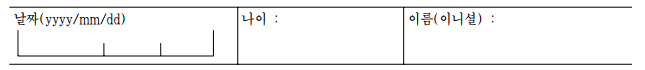전립선비대증 변증도구 개발 기초 연구
Development of a Basic Standard Tool for Pattern Identification of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BPH)
Article information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tandard tool of pattern identification, which will be applied to clinical research, for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Method
The items and structure of the instrument were based on a review of the published literature in China and Korea. The advisory committee on this study included 11 kidney-endocrine professors of the Korean Medical Colleges Division and 4 Korean medicine doctors who had a doctor’s degree in the Kidney-Endocrine Division. The advisory committee was questioned regarding pattern identification importance, symptom weight, treatment importance, changes in the symptoms, rare changes in the symptoms, and frequency of prescriptions regarding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Results
The Korean instrument of pattern identification was completed; it was composed of four questions for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Conclusion
We sincerely look forward to improving the instrument through the continuous clinical studies.
I. 서 론
전립선비대증은 적어도 50세 이상의 남성에서 비대해진 전립선이 방광출구폐색을 일으켜 다양한 하부요로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1. 임상증상으로는 배뇨장애, 빈뇨, 잔뇨감 등이 있다2. 전립선비대증은 남성 배뇨 장애 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질환으로3 40대 남성의 경우 20% 정도가 진단 받고, 70대에는 유병률이 90%에 이를 정도로 노년기 남성에서 가장 흔하다4.
전립선비대증의 원인과 기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노화와 고환의 존재가 원인 인자이며5, 연령의 증가와 함께 전립선비대증의 이환율이 증가되므로 성호르몬을 비롯한 내분비의 변화가 전립선비대증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6.
전립선비대증의 증상이 뚜렷하고 심하면 양방에서는 알파차단제 단독 또는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와의 병용요법을 실시한다7. 그러나, 이 두 약물은 부작용이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 알파차단제는 심혈관계 및 중추신경계의 기립성 저혈압, 두통, 어지러움, 무기력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며,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는 발기부전, 성욕장애, 사정장애 등이 나타난다8,9.
전립선비대증은 癃, 小便不通, 淋病 등의 범주에 속하며10 ≪內經≫에서는 膀胱과 三焦의 氣化不利에 의해 발생한다고 언급되었다11.
전립선비대증은 한의학적 치료가 양방 치료에 비해서 부작용이 적고 진단과 치료에 장점이 있는 분야이지만, 변증도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없었다. 이에 전문가 자문 위원회와 함께 전립선비대증 변증도구를 개발하였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연구방법은 ‘한의 변증 설문지 개발 표준프로세스 제안’12의 방법론을 준수하되 전립선비대증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된 형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1. 전문가 위원회 결성
전국 한의과대학 신계내과학 교수 10인 및 한방내과전문의 겸 박사학위 소지자이면서 임상경력 5년 이상 한의원 원장 5인으로 구성 되었다.
2. 자료수집
1) 문헌 선정
한국과 중국의 논문 및 단행본 중 전립선비대증의 변증과 관련된 문헌 22개를 선정하였으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Table 1).
(1) 한국 논문 및 단행본
검색엔진은 전통의학포털(OASIS), 한국학술정보 (KISS), 누리미디어(DBpia)를 사용하였으며, 2015년 12월까지 발행된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검색어를 ‘전립선비대증’으로 하여 검색한 결과 총 6개의 논문이 검색되었으나, 이 중 변증과 관련된 논문은 없었다. 또한 대한한의학회지, 대한한방내과학지, 동의생리병리학회지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추가로 진행하였다. 또한 현재 한국 한의과대학에서 사용되는 신계내과학 교과서13를 참고 하였고, 단행본 중에서 변증명이 기술되었어도 증상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제외하였다.
(2) 중국 논문 및 단행본
검색엔진은 China knowledge Resource Integrated Database(CNKI)을 사용하였으며, 검색기간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로 제한하여 최근 10년에 해당하는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검색어는 ‘前列腺肥大’, ‘前列腺增大’, ‘前列腺增生’, ‘前列腺增大症’, ‘前列腺增生症’,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BPH’, ‘癃闭’ 및 ‘辨證’을 조합하여 검색한 결과 44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이 중 전립선비대증과 관련이 없거나, 변증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거나, 변증명이 기술되었어도 증상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은 논문은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2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또한 검색을 통하여 2000년대 이후 간행된 중국 단행본 중 전립선비대증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중의내과학’, ‘중의남과학’, ‘중서의결합남과학’ 단행본을 수집하였고, 이 중 변증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은 단행본은 제외하여 총 8개의 단행본14-21을 선정하였다.
3. 변증유형 및 증상 추출
1) 변증유형 추출
선정된 22개의 문헌에서 각각 전립선비대증 질환의 변증을 22개 추출한 후 이를 개별 변증별로 유사한 것끼리 묶어 출현빈도를 분석하였다. 이 중 가장 대표성이 있고 높은 빈도로 표현된 변증유형을 최종 7개의 변증유형으로 선정하였다.
2) 주요 증상 추출
선정된 변증유형내의 각 증상을 인체의 병증 부위 및 병증 양상 범주별로 분류하였으며, 범주 내의 증상출현 빈도가 최다이거나, 대표성이 있는 증상을 채택하여 대표증상으로 선정하였다.
4. 한국어 번역 및 국어학자 검토
연구자 회의를 통하여 1차적으로 대표증상을 한국어로 번역 한 후, 외부 전문가[국문과 중문에 능통한 중의사 2인(1인은 한국국적, 1인은 중국국적)]의 서면 자문을 받았다. 외부 전문가 2인의 의견이 같으면 수용, 2인의 의견이 다르면 연구자 회의를 통해 수정하였다. 이후 2차 자문에 전문가위원회 15인에게 한글표현의 타당성을 평가 받았고, 연구자 회의에서 최종 결정 하였다.
5. 전문가 위원회 자문
1) 전문가 자문단
전립선비대증 변증도구 개발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전립선비대증 변증유형의 중요도와 임상적 활용, 학술적 측면에서 각각의 변증유형이 적절한지 문의하였다.
2) 1차 자문
(1) 자문항목
① 문헌의 적합성
전립선비대증 문헌의 선정(22권)이 전체적으로 전립선비대증 변증도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적합한지 0-100점 사이로 평가하였다(1 : 미미 (0-20점), 2 : 약간(20-40점), 3 : 어느 정도(40-60점), 4 : 상당히(60-80점), 5 : 매우(80-100점)). 또한, 추가하거나 삭제해야 할 문헌이 있으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문의하였다.
② 변증유형의 중요도
문헌조사를 통하여 선정된 7개의 전립선비대증 변증유형의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③ 변증별 증상의 포함 여부 및 중요도
각 증상의 해당 변증유형에서 중요도를 리커드 척도를 통해서 평가하였다(5점. 80-100 : 매우 중요하다. 4점. 60~80 : 상당히 중요하다. 3점. 40~60 : 어느 정도 중요하다. 2점. 20~40 : 약간 중요하다. 1점. 0~20 : 미미하게 중요하다).
이들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여 증상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표준점수를 산출하였으며, 델파이 기법을 사용하여 표준점수를 해당 증상의 가중치로 평가하였다1).
3) 2차 자문
각 임상지표(증상) 평가 시 원활한 통계처리를 위하여 누락 부분은 최대한 없도록 평가하도록 하였다.
(1) 자문항목
① 치료(호전여부) 평가에 있어서의 중요도
변증에 따라 한의학적 치료를 시행하였을 때 그 치료가 적절하였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어떤 임상지표가 중요한지 알기 위해 치료평가 중요도를 리커드 척도를 통해 평가하였다. 또한, 이들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여 증상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표준점수를 산출하였으며, 델파이 기법을 사용하여 표준점수를 해당 증상의 가중치료 평가하였다2).
② 소증과 변증에 대한 평가
적절한 치료가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증상의 특성상 쉽게 변하지 않는 임상 지표를 소증(素症), 쉽게 변화하는 임상지표를 변증(變症)이라고 정의한 후 각각의 임상지표가 소증, 변증 어느 쪽에 속하는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각 소증, 변증에 대한 평가 역시 리커드 척도를 통해 평가하였다. 또한, 이들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여 증상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표준점수를 산출하였으며, 델파이 기법을 사용하여 표준점수를 해당 증상의 가중치로 평가하였다3).
③ 평가도구로서의 최종 가중치 평가
임상지표(증상)로 사용할 때의 최종 가중치를 결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에 치료평가 중요도와 소증, 변증에 가중치를 자문 하였다. 예를 들어 증상에 대해 치료 평가에 있어서의 중요도가 높고 변증(變症)에서 속한다면 평가도구로 사용할 때 그 증상은 가중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중요도는 높지만 소증(素症)에 속하거나, 변증(變症)에 속하지만 중요도가 낮으면 가중치를 낮게 평가하도록 하였다. 치료평가 중요도와 소증, 변증에 대한 평가를 합이 100%가 되게 하였다. 치료평가의 중요도와 소증, 변증평가에 대한 자문 내용을 치료평가 중요도와 소증, 변증의 가중치에 따라 통합하여 각 변증유형별 문항의 최종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④ 각 변증별 임상지표(증상)의 의사 평가가 필요한지 여부
맥진, 설진 또는 임상지표(증상) 중에 반드시 의사가 평가해야하는 항목이 있는지 자문을 받았다.
⑤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임상적 다빈도 처방
1차 자문의 변증 중요도와 실제 임상에서 활용되는 변증유형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각 자문위원들에게 전립선비대증에 많이 쓰는 처방을 조사하였다. 다빈도 처방을 순서대로 기록하고, 사용 빈도는 백분율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단, 처방의 개수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III. 결 과
1. 문헌조사를 통한 전립선비대증 주요 변증 및 증상 추출
1) 변증유형
총 118회의 변증 출현 횟수 중 관련 변증명이 몇 회 출현 했는지 계산 후, 유사한 변증명을 통합하고, 대표성을 고려해서 변증명을 결정하였다. 변증명은 다음과 같다.
(1) 肝氣鬱結 : 14.40%(17/118)
(2) 肺熱壅盛 : 11.01%(13/118)
(3) 腎陽虛衰 : 16.10%(19/118)
(4) 腎陰不足 : 12.71%(15/118)
(5) 下焦濕熱 : 19.49%(23/118)
(6) 中氣不足 : 12.71%(15/118)
(7) 痰瘀阻塞 : 13.55%(16/118)
2) 변증별 주요 증상 및 한글화 작업
각 변증별 증상을 연구자 회의를 거쳐 인체의 병변 진단 부위에 따라 분류하고 증상을 취합하였다. 병변 부위는 小便, 大便, 咽喉, 口, 頭面, 情神, 腰脅, 下腹, 舌, 脈, 全身, 呼吸, 言語, 消和, 生殖器 부위로 분류하였다. 해당되는 증상을 분류한 각 병변 진단 부위에 따라 정리하였다.
2. 전문가 자문 결과
1) 1차 자문결과
(1) 문헌의 적합성
자문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문헌의 적합도는 5점 만점에 4.3±0.70으로 나타났다.
(2) 변증유형의 중요도
변증유형의 중요도는 腎陽虛衰, 腎陰不足, 下焦濕熱, 中氣不足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Table 2).
(3) 각 변증별 중요도 및 가중치
肝氣鬱滯 변증유형에서는 脇腹脹滿, 肺熱壅盛 변증유형에서는 呼吸急促 或有咳嗽, 腎陽虛衰 변증유형에서는 腰膝酸軟, 腎陰不足 변증유형에서는 咽乾心煩, 下焦濕熱 변증유형에서는 苔黃膩, 中氣不足 변증유형에서는 體倦乏力, 痰瘀阻塞 변증유형에서는 甚則阻塞不通이 각각 가중치가 가장 높게 나왔다(Table 3-9).
2) 2차 자문결과
(1) 치료평가 및 소증, 변증에 대한 가중치
치료평가의 중요도와 소증, 변증평가에 대한 자문 내용을 중요도에 따라 각각 0.67과 0.33을 곱한 후에 통합하여 각 변증유형별 문항의 최종 가중치를 산출하였다(Table 10).
(2) 각 변증별 평가도구로서의 최종 가중치(Table 11-17).
(3) 전립선비대증 다빈도 처방
분석결과 八味地黃湯, 六味地黃湯, 八正散, 補中益氣湯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8).
3. 연구자 회의를 통한 [전립선비대증 변증도구] 최종 기안
전립선비대증 변증유형의 중요도, 다빈도 처방 등을 분석하여 전립선비대증 변증도구 최종 기안을 하였다. 최종 기안에서는 1차 자문결과에서 나온 변증유형의 중요도와 2차 자문결과에서 나온 다빈도 처방에서 각각 상위 4개의 변증유형 및 4개 처방을 참고하여 腎陽虛衰, 腎陰不足, 下焦濕熱, 中氣不足으로 최종 변증유형을 정리하였다. 脈診, 舌診은 의사의 평가가 필요한 항목으로 정리 하였다. 평가도구로서의 최종 가중치를 적용하여 [전립선비대증 변증도구]의 최종 기안을 하였다. 이후 문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일반인 20명을 대상으로 인지적 인터뷰(cognitive debriefing) 과정을 거쳐 설문 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전립선비대증 변증도구]를 완성하였다(별첨 부록).
IV. 고 찰
전립선비대증은 병리학적 용어로서 전립선이 커지고 이로 인해 요도저항이 증가하여 발생하는 배뇨장애 증상이다. 국내연구를 기준으로 하면 50세 이상 남성의 절반 정도에서 중등도 이상의 배뇨장애 증상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야간 빈뇨와 소변줄기가 약해지는 증상이 많다22.
전립선비대증은 40대 이상의 남성에서 주로 많으며 가장 중요한 원인은 Testosterone과 노화이다. 노년기가 되면 Testosterone 수치가 떨어지면서 전립선비대증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남성호르몬은 Testosterone과 DHT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DHT는 나이가 들어도 양에는 큰 변화가 없다23. 따라서 전립선비대증의 원인으로는 DHT보다 자연적인 노화에 의한 Testosterone의 감소 및 외부 요인이 영향을 더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 외부 요인으로는 비만, 유전, 대사증후군 등을 고려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대사증후군 환자들에게서 전립선비대증의 발병 빈도가 높다는 의견이 있다24.
전립선비대증의 증상은 하부요로증상의 범주에 포함된다. 전립선비대증의 증상은 소변을 본 후 2시간 이내에 다시 소변을 보며, 하루에 8회 이상 소변을 보는 빈뇨(frequency), 배뇨 후 소변이 남아있는 것 같은 잔뇨감(residual urine sense), 밤에 수면 중 소변을 보기 위해 일어나는 야간뇨(nocturia), 소변이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요단절(interruption), 요의가 느껴지면 참기 어려운 요절박(urgency), 요류가 약한 약뇨(weak stream), 배뇨시 힘을 주어야 하거나 기다려야 하는 요주저(hesitancy) 등이 있다24.
전립선비대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병력 청취, 직장수지 검사, 요검사(현미경적/양성시 배양검사), 혈청 크레아틴 수치 측정, 70세 이하에서 PSA 측정 등을 한다25.
전립선비대증의 양방 내과적 처치로는 알파차단제,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항콜린제가 있으며 생약 및 보완대체요법이 있다. 알파차단제는 전립선비대증의 1차 치료제로 알파 교감신경을 차단하여 방광출구를 이완시키는 작용을 한다.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는 DHT의 변환을 막는 작용을 하여 전립선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보통 6개월 정도 사용하면 전립선의 크기가 줄어든다고 보고되어 있다21. 그러나, 알파차단제는 부작용으로 두통, 현기, 피로, 코막힘, 기립성 저혈압이 보고되어 있으며,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의 대표적인 약물인 finasteride는 복용 시 성욕감퇴, 사정량 감소, 발기부전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어 있다26. 생약 및 보완대체요법은 아직까지 장기간의 임상 결과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전립선비대증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생약제제로 톱야자 추출물(Saw Palmetto), 아프리카 서양자두나무(African Plum), 하이포시스 루페리(Hypoxis Rooperi), 호밀(Secale Cereale),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콩류, 아연 등이 있다27.
전립선비대증은 癃閉의 범주에 속하며,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연구로는 김 등의 전립선비대증의 변증에 따른 약물요법, 침구요법 등에 대한 연구28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표준화된 변증 도구 개발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팀은 전국의 신계내과학 교수, 한방내과 전문의 겸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임상경력 5년 이상의 한의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결성하고, 자문을 받아 전립선비대증 변증도구를 개발 하였다.
전립선비대증 변증도구 개발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단행본 및 논문 22권을 선정하였다. 한국 문헌은 신계내과학 교과서를 선정하였으며, 전립선비대증으로 논문 검색을 하였으나, 변증과 관련된 논문은 없었다. 중국 문헌은 ‘중의내과학’, ‘중의남과학’, ‘중서의결합남과학’ 등 8개의 단행본을 참고하였으며, 중국논문은 CNKI를 사용하여 前列腺肥大 등의 검색어를 사용한 결과 변증과 관련된 논문을 12편 찾을 수 있었다. 중국의 경우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변증관련 논문을 다수 찾을 수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전립선비대증의 변증유형에 대한 표준지침을 만든 논문은 없었다.
선정된 문헌에서 총 22개의 변증을 추출하고 연구자 회의를 통해 유사 변증유형별로 통합한 후 출현빈도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肝氣鬱結, 肺熱壅盛, 腎陽虛衰, 腎陰不足, 下焦濕熱, 中氣不足, 尿道阻塞 등 총 7개의 변증유형으로 정리하였다.
각 변증별 증상을 연구자 회의를 거쳐 인체의 병변 부위를 小便, 大便, 咽喉 口, 頭面, 情神, 腰脅, 下腹, 舌, 脈, 全身, 呼吸, 言語, 消和, 生殖器 분류하였다. 해당하는 증상을 분류된 각 병변 진단 부위에 따라 정리한 후 변증유형 안에서 출현 빈도수가 높고 각 변증을 대표하는 증상을 연구자 회의를 거쳐 각 인체 병변 부위별 대표증상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중국어 전문가와 한국어 전문가의 감수를 거쳐 전립선비대증 변증도구의 초안을 완성 하였다.
전립선비대증 변증도구 개발을 위한 문헌의 적합성과 각 변증유형의 중요도 및 변증유형별 임상증상의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15명의 자문위원회에 1차 자문을 구하였다. 각 변증별 증상을 “5점 : 매우 중요하다. 4점 : 상당히 중요하다. 3점 : 어느 정도 중요하다. 2점 : 약간 중요하다. 1점 : 미미하게 중요하다.”와 같이 리커드 척도를 통해 평가하였다. 이후, 델파이 통계 기법을 통하여 평균점수와 편차를 가중치에 반영 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서 [전립선비대증의 변증도구 1차 초안]이 완성되었다. 자문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문헌의 적합도는 5점 만점에 4.3±0.70점으로 나타났다. 변증 유형의 중요도는 腎陽虛衰, 腎陰不足, 下焦濕熱, 中氣不足, 肝氣鬱結, 尿道阻塞, 肺熱壅盛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腎陽虛衰, 腎陰不足의 가중치가 각각 24.8, 19.5로 높았고, 肺熱壅盛은 가중치가 7.5로 낮은 관련성을 보였다.
전립선비대증 변증도구와 실제 임상과의 관련성을 높이고 한의 임상연구를 실시할 때 어떤 치료가 효과적인지를 평가하기 위해, 전립선비대증 변증도구 1차 초안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위원회에 2차 자문을 하였다. 1차 자문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때 변증유형의 호전도를 평가하고, 쉽게 변하지 않는 증상(소증), 쉽게 변화되는 증상(변증)에 대한 각각의 가중치를 평가하였다. 또한, 각 변증별 증상의 평가도구로서의 최종 가중치를 구하기 위해, 치료평가의 중요도와 소증, 변증에 대한 중요도를 자문 하였다. 최종 가중치에서 치료 평가에 있어서의 중요도와 소증, 변증 평가 결과를 각각 몇 %로 하면 좋은지 의견을 물었다. 자문 결과 치료평가의 중요도 67%, 소증, 변증에 대한 평가 33%로 가중치가 도출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각 변증별 평가도구로서의 최종 가중치가 도출 되었다(Table 11-17).
또한, 2차 자문에서 각 자문 위원에게 전립선비대증에서 다빈도로 사용하는 처방을 자문 하였다. 이를 토대로 도출한 결과, 八味地黃湯, 六味地黃湯, 八正散, 補中益氣湯이 각각 23.3%, 21%, 20%, 8.3% 순서대로 나왔다.
전립선비대증 변증유형은 1차 자문결과에서 나온 변증유형의 중요도와 2차 자문결과에서 나온 다빈도 처방에서 각각 상위 4개의 변증유형 및 4개 처방을 참고하여 腎陽虛衰, 腎陰不足, 下焦濕熱, 中氣不足으로 최종 변증유형을 정리하였다. 脈診, 舌診은 의사의 평가가 필요한 항목으로 정리 하였다. 평가도구로서의 최종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전문가위원회 15인에게 한글표현의 타당성을 평가 받았다. 연구자 회의의 최종결정을 토대로 전립선 전립선비대증 변증도구에 대한 최종기안을 하였다.
최종안은 다음과 같다(부록 별첨). 환자 증상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자각증상 문항은 자가 기입 방식, 설진 맥진과 같이 관찰이 필요한 증상은 한의사가 기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각 전립선비대증 변증도구 최종안을 분석하면 각 변증별 증상에서 소변증상과 관련된 증상과 각 변증유형의 특징을 나타내는 증상이 가중치가 높게 나왔다. 腎陽虛衰 유형의 경우 첫 번째로 “아랫배 또는 음낭과 항문 사이에 차가운 느낌이 있다.” 두 번째로 “소변 줄기가 약하다.” 腎陰不足 유형의 경우 첫 번째로 “소변을 볼 때 요도가 화끈거리는 느낌이 있다.” 두 번째로 “과로하면 증상이 나타난다.” 下焦濕熱 유형의 경우 첫 번째로 “음낭에서 항문사이가 빠질 듯한 팽팽한 느낌이 든다.” 두 번째로 “소변이 방울방울 떨어지면서 잘 나오지 않는다.” 中氣不足 유형의 경우 첫 번째로 “소변을 보고 싶지만 나오지 않는다.” 두 번째로 “과로하면 증상이 더 심해진다.”와 같이 나타났다. 따라서 본 전립선비대증 변증도구의 가중치는 전립선비대증의 소변증상과 각 변증유형별 증상을 충실히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노인 남성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전립선비대증에 대해서 과학적 관점에서 문헌고찰 및 증상평가가 이루어진 점과 한의학적 관점으로 진단가 평가가 가능한 도구를 개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중국 문헌이 위주가 되다 보니, 국내의 다양한 연구를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 전문가 위원회의 합의를 거쳐서 타당성을 검증 받았으나 실제 임상에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한계로 남는다.
향후 전립선비대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전립선비대증 변증도구를 이용하여 임상에서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감사의 말씀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선도개발사업의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과제고유번호 : HI15C0006).
References
Appendices
Notes
<각 변증유형에서 개별 증상들에 대한 자문위원의 중요도의 반영>
(1): xijk: 변증유형(i=1, …,I)의 개별 증상(j=1,…Ji)에 대한 자문위원(k=1,…,Kij)의 중요도 값
(2) 개별 증상 중요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3) 개별 증상 중요도를 반영한 가중치 : zij
2) <각 치료(호전여부) 평가에 있어서의 중요도 개별 증상들에 대한 자문위원의 중요도의변증유형 반영>
(1) xijk : 변증유형(i=1, …,I)의 개별 증상(j=1,…Ji)에 대한 자문위원(k=1,…,Kij)의 중요도 값
(2) 개별 증상 중요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3) 개별 증상 중요도를 반영한 가중치 : zij
<각 변증유형에서 소증과 변증에 대한 평가에 대한 자문위원의 중요도의 반영>
(1) xijk : 변증유형(i=1, …,I)의 개별 증상(j=1,…Ji)에 대한 자문위원(k=1,…,Kij)의 중요도 값
(2) 개별 증상 중요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3) 개별 증상 중요도를 반영한 가중치 : zij